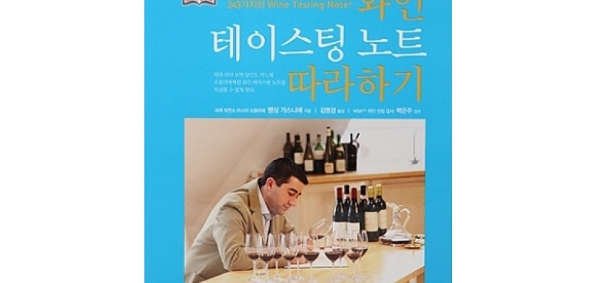한국은 화이트와인을 마시는 인구의 비율이 레드와인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 2015년 총 와인 수입량이 31.608톤인데 그 중 화이트 와인이 9482톤을 차지하니 한국인의 레드와인 사랑을 알고도 남는다. 레드와인 선호 이유야 와인의 종류만큼 많겠지만 한국음식의 특징도 이에 기여한다. 화이트 와인이 돋보이는 점은 섬세한 과일과 꽃 향기인데, 다양한 양념 맛이 어우러지는 한식과 마실 때 이 맛에 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직 알코올 맛만 느껴질 수 있다. 고심해서 고른 와인이 무미, 무취하니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고 소주를 마실 때와 다른 게 뭔가 싶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화이트 와인의 상당 부분은 이탈리아에서 물 건너온 것이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모스카토(moscato), 짙은 노란색에 실려오는 복합적인 향과 맛의 피노 그리조(pinot grigio), 품질 대비 가성비 좋은 소아베(soave)와 가비(gavi) 와인이 그 예이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익숙한 몇 가지 이탈리아 화이트와인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탈리아의 공신력 있는 원산지 명칭(DOC) 자료에 따르면 자생 화이트 품종만 146여 개에 달한다. 샤르도네, 리슬링, 소비뇽 블랑, 모스카토 와인이 익숙한 이들에게 146가지라는 숫자는, 평생 동안 그 와인의 레이블이나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한숨만 짓게 만들 뿐이다.
이탈리아 와인은 품종의 종류로도 압도적이지만, 각 품종이 자라는 곳마다 인간과 공생하면서 엮인 이야깃거리도 뒤지지 않는다. 그 중 하나는 중부 이탈리아가 무대인 화이트와인 삼각 지대 이야기다. 이곳은 토스카나, 라찌오, 움브리아 주의 경계가 접하는 곳으로 2500년 전부터 트레비아노, 그레케토, 말바시아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와인이 유명하며 이들 와인의 유명세 때문에 얽힌 이야기가 꽤 된다. 위 품종들은 이곳을 점령했던 에트루리아인, 그리스인이 들여온 품종으로 화산재 및 굳은 용암이 풍화에 의해 쌓인 화산토양에 잘 적응했다. 이 토양에서 자라는 포도는 칼륨, 마그네슘, 인, 미네랄을 흡수해 짚 색깔이 돌며 흰 꽃, 감귤, 사과 향을 풍기며 짠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화이트 와인으로 거듭난다.
이런 와인의 맛에 반한 첫 번째 사람은 독일 출신 주교 Defuk다. 12세기 초, 주교는 몬테피아스코네(Montefiascone) 마을을 지나다가 트레비아노와 말바시아를 섞어 만든 에스트(EST! EST!! EST!!!) 와인을 맛보게 된다. 주교는 이 와인의 맛에 반해 귀국을 포기하고 평생 이 와인을 마시면서 살겠다고 몬테피아스코네에 주저앉는다. 이 와인을 너무 마시다 보니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지만 자기가 죽으면 1년에 한 번씩 이 와인을 무덤 위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에스트 와인 사랑이 지극했다.
이 독일 성직자의 와인 사모곡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믿거나 말거나’ 전설도 있다. 때는 로마제국 멸망 후, 방어망이 뚫린 알프스 너머 게르만족이 침입해 이탈리아 정국은 어수선했다. 침입자 중 랑고바르드족은 오르비에토(Orvieto, 화이트와인 삼각지대 동쪽에 위치)까지 침입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약탈했다. 하루는 이들이 약탈한 금 접시와 잔이 갑자기 찬란히 빛나는 황금빛 와인으로 변했고 여기서 퍼지는 향기가 너무 감미로워 도적들은 이 액체를 맛보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였다. 한 모금 마시자 이들의 정신은 몽롱해졌고 그 틈을 타 오르비에토 주민들은 이들에게 오라를 지워 모두 감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이 전설의 발생지인 오르비에토를 어떤 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있는 두오모로 기억하고 어떤 이는 그 밑에 웅크리고 있는 지하의 세계로 기억할 것이다. 두오모로 기억한다면 성서 내용을 조각, 건축, 회화라는 도구로 표현했을 때 그 의도한 바가 두오모에 온전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갖가지 의미와 상징으로 돋을 새김 한 대리석이 대칭을 이루며 상승하다가 맵시 있는 첨탑 지붕으로 마무리된다. 지하 세계로 기억하는 이는 두오모의 화려함보다는 지하의 도시(Underground Orvieto)에 주목한 것일 게다. 다양한 크기의 동굴 수가 1200여 개에 이르며, 탐험대가 지하에 내려갈 때마다 또 다른 동굴을 발견하여 동굴 길이의 공식적인 발표를 미룰 정도다.

이 지하세계는 기원전 5세기 즈음 에투루리아인들이 식수를 찾기 위해 지하에 우물을 팠던 것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용암의 마그마가 굳어진 토양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마그마 가스 구멍을 통해 지하로 흘러 들어 점토층에 고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물이 고여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에 우물을 팠는데, 이중 가장 깊은 우물은 직경 3,4 m에 깊이가 36 m에 달하는 ‘포조 델라 카베르나’ 이다. 에트루리아인 집 지하마다 우물이 있어 그 수로 인구수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중세시대에는 인구가 늘어나 지상의 공간이 부족해진 탓에 상당수의 생산시설이 지하로 이동했다. 와인창고, 도자기 굽는 가마, 빵 집, 올리브 압착 시설 등 각자의 크기에 따라 동굴에 자리 잡았다. 동굴 내부는 연중 섭씨 14도, 습도는 90%를 유지해 와인 저장에 적절했으므로 와인창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지하 와인의 전통은 오늘날의 오르비에토 와인으로 이어진다. 트레비아노(trebbiano), 그레케토(grecchetto) 품종을 블랜딩 해서 만든 오르비에토 화이트와인은, 그것이 만들어진 지하 세계와는 정반대로 투명한 노란빛이 도는 청명한 와인이다.

트레비아노는 이탈리아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포도품종으로, Colli Piacentini 언덕을 굽이 흐르는 트레비아(Trebbia) 강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와인은 불휘발 성분이 많아 그 맛이 깊다. 그리스 품종임을 뜻하는 그레케토는 그 의미처럼 그리스인이 들여왔으며 과일 향이 싱그럽다. 트레비아노와 그레케토 두 품종의 매력이 녹아 있는 오르비에토 와인은 흰 꽃, 사과, 배, 호두 향이 화사하며 상큼한 산미에서 과일 맛이 묻어난다. 쌉쌀한 아몬드의 맛과 짭짤함의 조화가 혀 끝에 길게 머문다.
오르비에토 와인은 잔당의 양에 따라 네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품종 자체의 묘미를 느끼기에는 드라이 타입이 적당하고, 잔당이 약간 남아 산미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미디엄 드라이 타입도 있다. 당분이 좀더 많은 미디엄 스위트 타입은 매운 음식과 마시면 얼얼한 맛이 덜 하고, 스위트 타입은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와 함께 마신다.

,▲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을 통해 국내 유통 중인
루피노 오르비에또 클라시코Ruffino Orvieto Class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