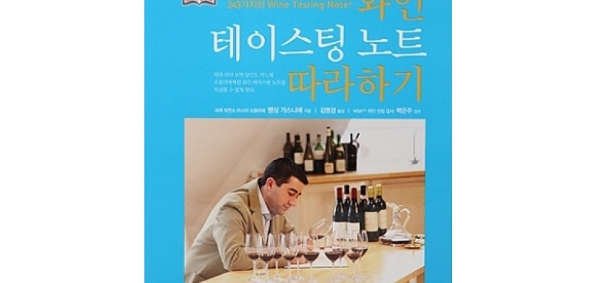견디기 힘든 폭염과 장마철 습기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그야말로 “먹다 버린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 만큼이나” 하찮고 후줄근하다. 오늘은 사람을 집어 삼킬 것 같이 이글거리는 콘크리트 빌딩 숲 아스팔트 지옥길의 열화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살아온 각자의 하루이거나 어느 여름날이다. 높은 체온 때문에 몸의 생기는 커녕 에너지 방전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다. 빠져나간 땀은 약간의 탈수증세를 동반하며 갈증과 짜증을 유발시키고 혈압까지 오르니, 그야말로 온 삭신이 그로기 상태다.
이럴 때, 집 나간 정신에 얼음물을 끼얹듯 또는 머리 속을 카프카의 ‘도끼’로 찍어 내리듯 온몸에 짜릿함의 벼락을 내릴 만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 영혼을 단박에 구원해 줄 아주 특별한 어떤 것 말이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시원하게 칠링된 샴페인 한 병, 그것 밖에 없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좀더 완벽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신경 써야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샴페인은 온도가 10-12도 사이일 때 가장 맛있는데, 여름철 실온에서는 잔에 담긴 샴페인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므로 세심한 온도조절이 절대적이다. 한 가지 방법은 얼음과 물을 채우고 샴페인을 담가 놓은 아이스버킷의 온도를, 적정 온도보다 2-3도 낮은 8-1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샴페인을 잔에 조금씩 따라 마시면 시원한 온도로 오래 즐길 수 있다.

오늘같이 밤 하늘은 푸르고 밤 공기가 습도를 약간 머금은 날에는 드라이하고 산도가 날카로운 샴페인(Brut)보다는 잔당이 살짝 느껴지는 샴페인(Sec)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나는 샴페인이 있으니, 바로 샴페인 명가 떼땅져Taittinger의 녹턴Noctune 이다. 18g/L의 감미로운 잔당은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에 충분하고 말린 살구, 청사과, 구운 아몬드, 갓 구운 빵의 풍미와 함께 농밀하고 부드러운 버블은 안주 필요없이 샴페인 자체로 빛을 발하게 만든다.
이 샴페인에는 그저, 쇼팽의 피아노곡 <녹턴> 중 ‘Nocturne No. 2 in E-flat, Op. 9 No. 2’와 ‘Nocturne No. 1 in B-flat Minot, Op. 9 No. 1’이면 족하겠다. 이왕이면 ‘샹송 프랑소와’나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과 구조적 완결성이 돋보이는 연주면 좋겠다. 흔히 샴페인을 두고 “잔 속의 별을 마신다”고 한다. 한여름 시원한 떼땅져 녹턴 샴페인 한 잔과 쇼팽의 멋진 음악으로 나의 영혼이 녹턴의 우주로 변해가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얼음이 가득 찬 아이스버킷 속에서 시원하게 칠링 중인 샴페인 한 잔, 끊임없이 솟는 청량한 버블에 파묻혀보자. 기분 좋은 산도가 지친 몸을 일깨운다. 구수한 효모 향과 흰 꽃 향, 기분 좋은 꿀 향이 코를 간지럽힌다. 시원하고 짜릿하게 목구멍을 핥고 내려가는 그 아찔하고 알싸한 투명함이라니… 이런 샴페인을 과연 누구라서 마다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안주도 필요 없다. 오직 “한 잔 더!”가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