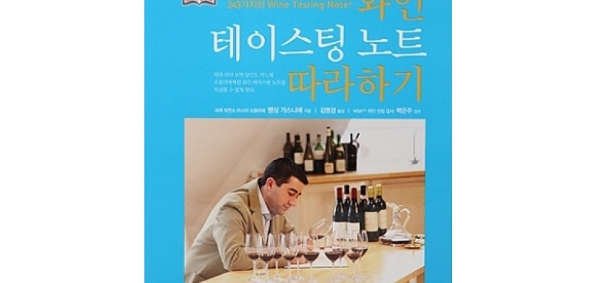사그란티노의 이유있는 날씬함

<사그란티노 안테프리마 2021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
어느 날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 조용해서 존재감이 거의 없던 이라면 더 놀랍다. 조용함은 참으로 고약하다. 말수가 적은 이는 일상도 무미건조 할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한다. 이는 침묵이 눈 밖에서 일어나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옅게 만드는 데서 일어난 착시가 원인이다. 만일, 공력이 드러나는 시점이 어려운 때라면 승부차기에서 결정골을 날리는 것과 같다.
인간사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와인에도 가끔 일어난다. 올해 시판되고 있는 2017년 산 몬테팔코 사그란티노가 그렇다. 2017년은 이탈리아 와인 키워드로 폭염과 가뭄을 내세울 정도로 어려운 해였다. 그러나 내공을 착실히 쌓았던 와인은 깨알 같은 밤하늘 별들을 제치고 빛나는 북극성과 같다.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사그란티노 안테프리마 미디어 시음회가 열렸다. 2017 빈티지 사그란티노를 두고 평가는 대체로 이랬다. “어려운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았고 타닌이 날씬해졌다”. 사그란티노 품종은 타닌 함량 순위로 줄을 세우면 맨 앞에 놓인다( 지난 칼럼 ”타닌으로 나를 이길 와인 없다” 참고). 이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15세기부터, 타닌의 거친 맛을 줄이거나 입안에 깊은 울림을 주는 성숙한 타닌을 얻는 것이 화두였다. 오죽하면 이러한 노력을 ‘타닌을 길들인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참고로 ‘길들이다’는 이탈리아어로 도마레(domare)라 하며 길들이는 대상은 야생동물이다.
사그란티노는 당분 양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제야 타닌이 익을 채비를 한다. 후자가 익기를 기다리다 보면 포도알은 당분을 계속 쌓아 놓는다. 당분이 많다 보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치솟으며 끈적거리고 단맛이 난다.
당분과 타닌이 서로 완숙기의 아구를 맞추지 못하면 생산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알코올 발효를 강제 중지시켜 잔당을 남기거나, 그것이 싫다면 효모가 당을 완전히 먹어치울 때까지 기다린다. 생산자들은 후자를 선호했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알코올이 16도인 사그란티노가 흔해졌다. 자연 효모에 맡기던 과거의 알코올 발효는 불안정해서 사그란티노는 단맛이 진했다.
사그란티노에게 고농도 알코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타닌이 워낙 많다 보니 보디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알코올 무게는 감당할 수 있다. 거기다 알코올이 내는 맛은 달기까지 해 떫은맛의 감도를 떨어뜨려 식감이 개선되는 부차적 효과도 있다. 그러던 타닌이 2017년에는 우아하며 날씬해졌다니, 무슨 일이 생긴걸까.
평행선인 당분과 타닌(페놀)의 익는 시기를 근접하게 맞추려 했던 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즉, 당분이 익는 속도에 제동을 걸어 타닌 익는 시기에 맞추었다. 여기에 발효 탱크 내부 온도를 저온(25~28°C)에 맞춘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 기간을 30 ~ 40일까지 연장하는 선택적 발효법을 알아냈다. 저온 환경에 놓인 껍질, 씨앗 등 고형물은 허구의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은 오크통 안과 환경이 흡사한데, 타닌은 이를 오크통인 줄 알고 주위의 단백질 분자와 결합하려 든다. 오크통에 레드와인을 숙성하면 타닌이 단백질, 다당류와 결합하려는 기질이 왕성해져 타닌이 한결 순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사그란티노 안테프리마는 동류 행사에 비해 배럴 와인 비율이 높다. 오크통에서 막 가져온 와인이 있는가 하면 병 안에서 맛을 가다듬고 있는 와인도 집어온다. 몬테팔코 사그란티노가 상품이 되려면 병과 오크통 안에서 최소 37개월을 숙성시켜야 한다. 즉, 수확한 해로부터 네번째를 맞는 해의 1월부터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아단티, 아르날도 카프라이, 타바리니 등 상당수 와이너리는 37개월 문턱을 가쁜히 초과한다. 2017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출시 시점은 더 늦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로마를 두고는 과실, 향신료, 부케 등 기본 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자두, 블랙베리, 체리, 피망, 후추, 한약재의 허브 향, 정향, 초콜릿, 타바코 향이 조화롭다. 타닌이 순해졌다고 하지만 중심에는 산미와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다. 혀 끝에서 입안 전체로 번지는 속도감, 타닌 촉이 지나는 곳마다 미각을 일깨우고 타액을 재빨리 말린다.
본 행사는 몬테팔코 로쏘, 몬테팔코 로쏘 리제르바, 몬테팔코 그레게토, 스포레토 트레비아노 스폴레티노 같은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몬테팔코 지역 DOC급 와인이 풍성하게 등장한다.
몬테팔코 로쏘는 DOC와인이 DOCG급 보다 가볍거나 엔트리급 일거란 선입관을 깬다. DOCG 자격 심사에서 떨어진 와인의 탈출구는 더더욱 아니다. 일단 품종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두 등급은 품종 구성과 비율이 흡사한 반면 몬테팔코 로쏘는 주품종이 산조베제고 사그란티노는 보조로 밀려난다. 블랜딩 비율이 산조베제는 최소 60%에서 최대 80 %, 나머지 10~25%는 사그란티노나 기타 품종이 메울 수 있다. 이는 몬테팔코 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사그란티노는 원래 달게 마셨고 명절 때나 개봉했다. 소박하며 기름진 음식이 올라오는 평상식은 드라이한 맛의 산조베제가 맡았다.
몬테팔코 로쏘는 어떤 맛이 날까. 붉은색 과일, 붉은 꽃망울 같은 친근한 산조베제에 허브, 향신료, 광물 개성이 더해진다. 색상이 좀 더 붉어졌고 타닌은 묵직하며 깊은 맛을 지닌다. 이렇게 사그란티노는 존재감이 작아도 강력한 효력을 낸다.
최근에 트레비아노 스포레티노 화이트 와인이 선방하고 있다. 트레비아노 스포레티노는 품종명이고 이를 상품화한 와인이 스포레토 트레비아노 스포레티노(Spoleto Trebbiano Spoletino)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자라는 트레비아노 토스카노 품종과는 유전자부터 다르다. 몬테팔코에서 멀지 않은 스포레토(Spoleto)가 원산지며 고문서에 따르면 서기 2세기부터 재배가 번성했다. 재미있는 것은 언덕의 낮은 자락이나 계곡 밑에 자라는 포도는 마리타타란 전통방식으로 키운다. 단풍나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가지에 포도가 얹혀산다. 로마넬리 와이너리의 경우, 포도는 물푸레 나무에 자신의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다. 기생하는 나무 크기만큼 자신의 키를 키우기 때문에 수세가 매우 좋다. 예를 들면 로마넬리의 몇 그루밖에 안 되는 나무에서 매년 3천 병은 거뜬히 채울 만큼 열매가 열린다.

<로마넬리 와이너리의 레 테제(Le Tese )트레비아노 스포레티노 와인>
가뭄과 더위에 잘 견디며 화이트로는 드물게 만생종이고 수확철이 11월인 빈티지도 종종 있다. 남이탈리아 화이트는 아로마가 짙고 산미와 짠맛이 결합해 볼륨감이 풍성하다. 반면 트레비아노 스포레티노는 정수리를 꿰뚫을 기세로 산미가 날카롭다. 첫 아로마는 가냘프다가 서서히 여러 향기가 깨어나면서 복합미를 완성해가는 북유럽 스타일이다. 두꺼운 껍질을 십분 활용해서 암포라나 시멘트 용기에서 스킨 컨택 기간을 극도로 밀어붙이기도 한다. 감귤, 열대과일, 지중해 허브, 호두, 아몬드 향이 싱그럽고 병 숙성을 오래 하면 부싯돌, 스모키 향을 얻는다 .

<안토넬리 와이너리의 스포레토 트레비아노 스포리티노 와인>
앞서 언급한대로, 본 시음회는 배럴 와인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시음회와 병행한 와이너리 방문 일정이 꽉 잡혀있다. 배럴 테이스팅을 잘 기억했다가 와이너리에 가서 숙성을 마친 와인과 비교해 보라는 의도다. 테이스팅만 집중하는 동류의 안테프리마와는 다르다. 와이너리에서 마시는 와인만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 어디 있을까(물론, 연인과 친구랑 마시는 와인과는 비교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사그란티노 와인은 오래 마셔 온 것에 비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년 안팎이다. 수 세대 대물림하는 와이너리도 있지만 대다수는 신생이다. 이는 사업 등록하고 정식으로 와인을 만든 지가 최근이란 거지, 십중팔구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포도농사를 지어온 뼛속 농부다. 여기에 외부 와이너리 투자도 가세해 몬테팔코는 그야말로 역동적이다. 필자에게 다양한 이력을 가진 와이너리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어지는 글 “성공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비결- 전통, 혁신, 밀레니얼”에서 와이너리 방문기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