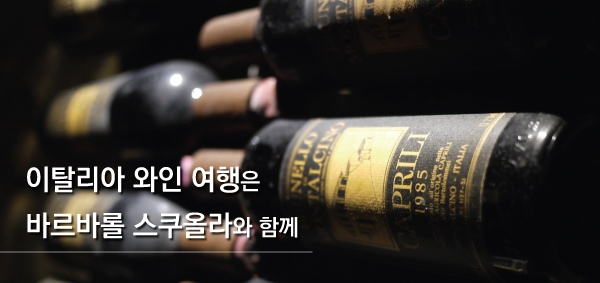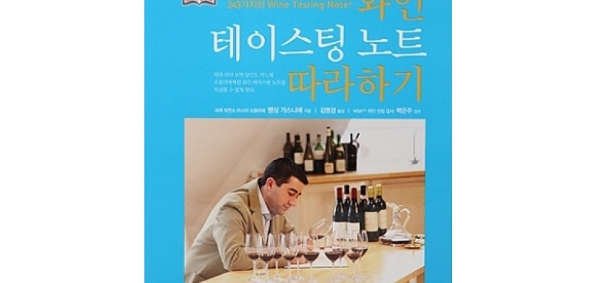토스카나의 맛과 향을 찾아서
토스카나 전통요리인 비스테까 알라 피오렌티나(bistecca alla fiorentina)는 소의 허리 끝에 달린 T자 모양의 뼈 양쪽에 붙어있는 안심과 등심을 그릴에서 구워낸 요리다. 비스테까의 참맛은, 토종소 끼아니나(chianina) 종의 등에서부터 허리 부위를 열흘 이상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고기 양면을 뒤적거리지 않고 단번에 굽는데서 오는데,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표면을 포크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육즙이 흘러나올 것 같다.

피렌체식 스테이크인 이 요리는 ‘피렌체 T본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토스카나 전통 레스토랑 메뉴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보통 살짝 익힌(rare) 정도로 굽기 때문에, 입안에 고이는 육즙을 말려줄 정도의 타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스테까의 도톰한 두께처럼 맛과 향기가 깊은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린다. 풀보디의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차노 또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미디엄 보디의 모렐리노 디 스칸사노(Morellino di Scansano) 또는 끼안티 등, 상당수의 토스카나 레드 와인은 마치 비스테까와 함께 마시기 위해 양조된 것마냥 잘 어울린다.

끼안티 와인을 낳은 피렌체 주변의 낮은 언덕, 그리고 브루넬로 몬탈치노와 비노 노빌레 몬테풀차노 와인으로 유명한 발 도르차 계곡(Valle d’Orcia)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절경이지만 예전에는 들짐승의 출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잦았다. 이곳에서 사냥이 금지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금세기 초 만해도 사냥고기는 흔한 식재료였다.
예를 들면 고기를 숯불에 구워먹거나 훈제시켜 미래에 대비했고, 남은 고기를 다져서 토마토와 향신료를 넣고 뭉근히 끓이면 훌륭한 파스타 소스가 되었다. 이 소스를 라구(ragout)라 부르는데 우동 면발과 비슷한 피치(pici) 생파스타에 비벼먹었다. 이 요리에는 토스카나 와인 산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포미노 포도밭에서 자란 메를로와 카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한 포미노(Pomino DOC) 와인, 또는 산조베제 특유의 산미와 타닌이 튀지 않는 카르미냐노(Carmignano DOCG)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린다.

토스카나 주는 총 6만 헥타르의 포도밭에서 연간 약 2백 6십만 헥토리터의 와인을 생산한다(이는 1년 동안 한국인이 마시는 와인 소비량의 약 10배에 달한다). 타입 별로 보면 70%는 레드 와인, 나머지는 화이트, 로제, 스위트 와인 순이며, 2014년 현재 DOCG 등급으로 지정된 11종류의 와인 중 레드 와인이 9개나 된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 등급 와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는 피에몬테인데, 16개의 DOCG 등급 와인 중 레드 와인은 11개다. 이러한 비교는 토스카나 주에서 레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양적인 면에서 레드 와인이 압도적이지만 토착 적포도 품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탈리아의 다른 산지보다 뒤진다. 재배되는 곳에 따라 부르넬로(brunello), 푸르뇰로 젠틸레(prugnolo gentile), 모렐리노(morellino)로 불리는 산조베제 품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토착 적포도 품종으로 만든 수준급의 와인은 없다. 이는, 토스카나가 산조베제 와인 생산에는 적합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품종 와인과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최근에는 카나이올로와 칠리에졸로 품종의 블렌딩 비율을 달리하거나 청포도 품종을 섞지 않고 카베르네와 메를로 품종으로 대체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크기가 다양한 나무 용기에서 발효, 숙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잊혀졌던 시멘트 발효통을 다시 사용하는 곳도 늘고 있다. 양조과정의 다양화 외에, 와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와 일화를 특정 산조베제 와인과 결부시키는 차별화된 마케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스카나의 전통음식을 이야기할 때,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 왕비가 된 카트린 공주를 빠트릴 수 없다. 카트린 드 메디치 공주는 프랑스 발로아(Valois) 왕가의 앙리4세의 왕비로 채택되어 프랑스 궁정으로 가게 된다. 공주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 어깨너머로 배운 각종 요리법을 적어두었고 이는 결혼을 계기로 프랑스 궁정에 전달된다. 그녀에 의해 소개된 토스카나 요리는 베샤멜 소스(화이트 소스), 오렌지소스 오리요리(Anatra all’ Arancia), 로솔리오(장미줄기와 알콜로 만든 알콜) 등이 있으며, 메디치 식탁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던 포크 역시 토스카나 국경을 넘어 유럽에 알려지게 된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세련된 음식문화를 가졌던 토스카나는 쿠치나 포베라(Cucina povera)를 낳은 소박한 음식의 고장이기도 하다. 몇 가지 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한 음식을 뜻하는 쿠치나 포베라는 토스카나에서 흔하게 재배되던 농산물(콩, 고기, 올리브 오일 등)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며, 10세기 전후 낮은 신분 계층의 식습관과 맞아떨어졌다.
귀족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던 하인들은 비록 남긴 음식이지만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 몇 가지 지혜를 동원했다. 남은 야채와 굳어진 빵을 오랫동안 끓여 걸쭉한 야채수프의 일종인 리볼리타(Ribollita)를 만들었고, 버려진 토마토를 비슷하게 요리해서 팝파 알 포모도로(Pappa al pomodoro)를 만들어 먹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신속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탈리아인들의 사랑을 받는 부르스케타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버리지 않고 모아둔 닭간, 비장에 케이퍼, 엔초비를 섞어 뭉근히 끓인 후 갈면 파테(Pate)처럼 되는데, 이를 구운 빵에 발라먹던 요리가 브루스케타이다.

위의 세가지 음식은 요리법은 다르지만 빵이 감초처럼 등장한다. 토스카나 빵은 소금을 넣지 않아 맛이 심심한데, 빵에 소금을 넣지않게 된 사연은 11세기 경 피렌체와 피사 공화국 간의 소금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르노(Arno)강 하구에 위치하며 해상 무역을 주름잡고 있던 피사공화국은 같은 강 상류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피렌체를 곤궁에 빠트리기로 한다. 다름아닌 소금을 실은 배가 아르노강 상류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소금이 금값이 되었고 피렌체 시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소금 없이 빵을 구웠다. 단기간에 겪은 불편함이었지만 이는 피렌체의 제빵 전통이 되었다. 빵은 어디까지나 주요리와 함께하는 보조음식이기 때문에 무미(無味)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사실 살라메, 치즈, 파스타 등 토스카나 음식은 짭짤하기 때문에 무염빵과 같이 먹으면 간이 잘 맞는다.
간소한 재료로 만든 단순한 요리, 쿠치나 포베라에는 토스카나의 소박한 화이트 와인이 어울린다. 예를 들어 생산된 지 1~2년 된, 또렷한 산미와 산뜻한 과일, 꽃 향기가 싱그러운 트레비아노 (trebbiano toscano)와 말바시아를 블렌딩한 와인이면 무난하다. 토스카나의 서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베르멘티노 와인도 좋은데, 함께 할 음식의 맛과 향의 강도에 따라 고르면 된다. 야채스프에 빵을 넣어 파스타의 식감을 살린 리볼리타 그리고 무염빵과 함께 먹는 피노끼오나(finocchiona) 살라메에는, 또렷한 과일향과 미네랄향이 나는 토스카나 북서 해안의 루니 베르멘티노(Colli di Luni Vermentino)와 마렘마 베르멘티노(Maremma Vermentino) 와인을 곁들이면 좋다. 파테를 바른 브루스케타와 토마토가 주재료인 팝파 알 포모도로는, 비오니에와 블렌딩한 후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농익은 과일과 부드러운 산미를 지닌 볼게리 베르멘티노가 어울린다.

△ 베르멘티노 와인
꿀, 아몬드, 설탕, 허브, 밀가루를 재료로 넓적하게 구운 다음 뜨거울 때 듬성듬성 자른 칸투치니 과자는 칼로리도 부담스럽지 않아 손이 계속 간다. 칸투치니와 동일한 재료에 시럽에 절인 과일과 카카오를 추가한 판포르테(panforte)는 눌러놓은 케이크처럼 모양이 납작하며 강한 맛이 난다. 색과 맛이 다른 이 두 가지 디저트는 토스카나의 달콤함 빈 산토와 같이하면 좋다. 깨물때 톡 소리를 내며 씹히는 아몬드가 일품인 칸투치니는 트레비아노와 말바시아로 만든 짙은 갈색의 빈 산토에 적셔서 먹을 때 제 맛이 난다. 드라이한 레드 와인에 익숙한 애호가들에게는 산조베제의 달콤한 변신이라 할 수 있는 오끼오 디 페르니체(Vin Santo Occhio di Pernice) 빈산토를 추천한다.
예전에 토스카나인들은 집안마다 내려오는 비법으로 빈산토를 만들어 두었다가 손님이나 친구가 오면 한 잔씩 내놓았다. 빈산토의 달콤함은 포도의 농축된 당도에서 오는게 아니라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빚는 데서 오기 때문에, 우정을 돈독히하는데 빈산토만한 와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빈산토는 품종만 다를 뿐 만드는 방법은 같은데, 빈산토의 비밀은 천장 밑 다락방과 마드리(madri)라 불리는 효모 박테리아다. 잘 익은 포도를 3~5개월 말린 후 압착한 포도즙을 50리터짜리 카라텔리(caratelli) 밤나무 통에 넣고 석회반죽으로 입구를 단단히 봉해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한다. 이 통 안에는 수십 년, 아니, 나이를 알 수 없는 마드리가 살고 있는데 발효를 일으킨 후 빈산토 특유의 맛과 향이 일어나는 숙성에 관여한다. 마드리의 활동은 지붕 밑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공간에서 제대로 발휘된다. 낮에는 지붕열에 달궈지고 밤에는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빈산토의 산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끝>

※ 토스카나 음식과 와인을 다양하게 체험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대구 MBC <뿌리깊은 식탁> 취재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